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본문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분야로 전락해버렸다.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비효율의 깊은 늪에 빠져버렸다는 평가다. 연간 19조에 이르는 재정이 투입되지만 정작 사업화에 성공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무는 외면하고 무용지물인 논문과 특허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이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공연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고위 관료의 지적도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놓은 혁신방안과 미래부의 세부 실행방안이 몹시 어설프다.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로 포장한다고 낯선 프라운호퍼가 우리 것이 되지는 않는다. 출연연과 대학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무작정 강요해서도 안 된다. 과학기술에 대해 문외한인 문과 출신 정책 전문가들로 채워질 과학기술전략본부와 과학기술정책원에 대한 성급한 기대도 섣부른 것이다. 정치적으로 오염된 선임 절차는 그냥 두고 기관장의 임기만 늘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신하겠다는 주장이 몹시 공허하게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혁신방안과 실행방안의 핵심이 중소‧중견기업이다.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연연과 대학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현장을 모르는 관료와 정책 전문가들에게는 그럴 듯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대기업의 시스템과 중소기업의 순박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중견기업의 현실을 철저하게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적 발상이다. 누구보다 ‘돈’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일인 기업주의 독선과 만행이 판을 치는 정글에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과학자들이 온전하게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성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대조차 할 수 없고, 자칫하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영상의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떠맡게 될 위험도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정부가 끈질기게 추진해왔던 산학협력 정책이 실패했던 것은 그런 현실 때문이었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과의 마찰에서 출연연이나 과학자를 지켜주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출연연이나 과학자가 50만 개가 넘는다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윤리성이나 투명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순진하게 연구소기업 설립 장려 정책을 믿었다가 지옥의 문 앞까지 갔다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한국기계연구원의 송치성 박사의 사례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비효율의 늪에 빠지도록 만든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연구개발의 현장은 없고, 남의 것을 어설프게 흉내 낸 정책만 과잉으로 넘쳐나고 있는 정부가 진짜 문제다. 과학자들을 양 떼 몰 듯 잘 관리하면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 성과가 마구 쏟아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문과 출신 관료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황당한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가 쏟아낸 대부분의 과학기술 정책이 실제로 다른 나라 제도와 정책의 껍데기만 표절한 ‘짝퉁’이고,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엉터리’였다.
그동안 출연연의 연구자들의 목을 죄어왔던 PBS가 그렇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빠짐없이 구조조정 1순위였던 ‘연구회’가 그렇다. 연구재단은 미국의 NSF를 베낀 것이고, 정체와 목표도 불확실한 기초과학연구원도 유럽의 핵물리연구소(CNRS)와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를 마구 뒤섞어 놓은 괴물이다. SRC·ERC·창의과제 등의 이름만 화려한 연구지원 사업도 대부분 정체불명의 불량 짝퉁이다. 정부가 하향식으로 결정하는 대형 국책 과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국을 흉내 내기 위해 만들어낸 짝퉁 과제가 훨씬 더 많았다. 남이 장에 가니 우리는 속 빈 짝퉁이라도 지고 따라가야겠다는 식이다.
과학기술계에 시도 때도 없이 불어 닥치는 낯선 열풍도 관료와 정책 전문가들의 작품이다. 스타워스가 유행했을 때는 조지 루카스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우리 과학기술계의 역할 모델이었다. 일등만 살아남는다는 구호가 요란했다. 그동안 우리가 흉내 내는 척이라도 해야 했던 성공 사례는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도 모자라 이제는 알리바바의 마윈까지 동경해야 하는 형편이다. ‘실리콘 밸리’와 ‘리서치파크’도 베껴야 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데스밸리’를 건너기 위한 방안도 모방을 해야 했다. ‘컨버전스’(융복합)가 대세였던 적도 있었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모르면 행세를 할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낯선 이스라엘을 배워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고위관료도 있었다.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개최했다는 ‘메이커 페어’를 창조경제의 과학문화적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목소리도 있다. 모두가 정체불명의 무책임한 정책 전문가들이 경쟁적으로 번역해내는 알량한 ‘보고서’에서 시작되는 웃지 못 할 일이다. 선진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는 억지 주장 앞에서 과학자들은 속절없이 불량 짝퉁 제도와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짝퉁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진 관료도 없었고, 정책 전문가도 없었다.
짝퉁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과학기술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기술 개발 대신 논문과 특허 건수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변화는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PBS와 계량적 평가 제도의 결과였다. 논문·특허의 수와 인용지수를 근거로 과학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연구자가 아니라 관료와 전문가들이었다. 2007년 스마트 원자로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예비타당성 검토도 관료와 전문가들의 엉터리 작품이다. 우리의 황당한 예타 제도에서도 아이패드와 아이폰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과학기술 정책을 과학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과학기술이 그나마 지금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1980년대 말까지는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창의적 성과를 추구하는 과학자를 짝퉁 정책의 노예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은 과학기술 정책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자발적·주도적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공연히 연구자들을 옭죄던 엉터리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을 연구자들에게 던져주는 엄청난 시혜(施惠)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불량 짝퉁으로 과학기술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어설픈 관료와 정책 전문가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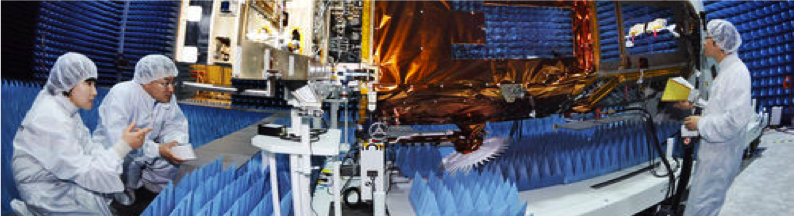
연구개발 현장을 이해할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선무당 수준의 엉터리 정책 전문가들을 양산하고 있는 경제학·경영학·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무절제한 문어발식 영역 확장을 경계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에너지·자원·환경·농수산·안전·방역 분야가 모두 어설픈 짝퉁 정책에 골병이 들고 있다. 휘발유를 본 적이 없는 에너지정책 전문가들이 망쳐놓은 우리 에너지 산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무당 수준의 엉터리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졸속 짝퉁 정책으로는 창조적인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 a
- 기사입력 2015년07월09일 19시57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7일 21시56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